on
지금은 달라질 것이 없다
Day+019 @Suzzallo Starbucks에서 쓰다.
1도의 움직임이 10도가 되는 것
공식적인 프로그램 시작일은 3월 19일이나 생활은 대체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기성(regularity)이다. 여기서는 어차피 나에게 갑작스럽게 일을 맡길 사람도 없고, 귀찮은 일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조절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큰 당면과제가 된다.
여튼 여기 와서는 대체로 잘 지내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기도 한데, 그 바탕에는 대부분 신문사라든지 연구실에서 배운 것들이 있다. 이래서 사람이 20대에 뭘 했는지가 중요한지도 몰라. 예전에 C오빠랑 그런 이야기한 적이 있다.
C: 내가 생각해봤는데, 결국 20대 초반에 걔가 뭘했는지가 지금 걔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니까? 아예 뇌 자체가 다른 것 같아.
그 이야기는 나도 크게 동의해서, 한동안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크게 맞다고 생각을 했다. 나도 20대 초반부터 신문이니 방송이니 하는 것들을 달고 살았고, 그때 취재원에게 하던 취재와 지금 하는 사용자 인터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르다면 방향의 다름이고, 관점의 다름이겠지. 20대 중반부에 뒤늦게 코딩을 시작했지만 딱히 그게 뭐 어쩌면 나와 안 맞아서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어떤 뇌 구조나 사고의 구성 자체를 바꾸기는 힘든 것처럼 느껴졌다. 나름대로 시간도 꽤 많이 투자했는데 말이지.
어쨌든 나는 20대 초반에 주로 ‘의심하는 법’을 배웠다. 인문대나 사회대에서는 끊임없이 의심한다. 과거에 대해 의심하고, 현재에 대해 의심하고, 사회에 대해 의심하고, 구조에 대해 의심하고, 나에 대해 의심하고… 끝없는 의심의 연속이다. 그렇게 물음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인문학의 요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의심하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괴롭다. 과정도 괴롭고 결과도 괴롭다. 그 많은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왜 그렇게 우울해하고 일찍 죽었겠는가?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그냥 멍청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매트릭스에서 괜히 그 빨간약 파란약이 나오는 게 아니다. 괜히 그 영화가 철학적으로 소비되는 게 아닌 것이다.
선생님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유가 많아진다고 했지만 나는 그 진술에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반대한다. 아는 게 많아질수록 제약이 많아진다. 세상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유로워지기보다, 자기자신을 구속하게 된다. 그냥 내가 느끼기엔 그러하다. 물론 뭐 용감한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어, 뭐 쇼핑 산업에 대해서 의심해보자. 자본주의에 대한 의심, 경제구조에 대한 의심, 정책에 대한 의심… 물건 살 수 있을까? 게다가 심지어 그런 구조가 자신의 신념과 반할 때, 그 개인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착취구조에 대해 반대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주 정직한 농산물만 먹고, 옷도 자급자족하고 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 현실과 타협한 자신에게도 혐오가 생기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도 될만한 리소스(대부분은 돈)가 없는 처지에도 화가날지도 모른다.
물론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대체로 나는 그냥 세계가 불공정하고, 불편하게 이뤄져있으며, 그 어딘가에서 나는 이득도 누리고 손해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산다. 하지만 그런 식의 상대적인 생각은 행복과 아주 가깝진 않다. 다행히 불행과도 가깝지 않으니… 그 정도면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사는 물론이고 연구실에서 일할 때도 그놈의 비판 정신과 의심하는 습관은 멈추지 않는다. 끊임없이 효과를 의심하고, 시스템을 의심하고(심지어 만들어 놓고도…) 뭐 그러는 것이다. 융대원에서 예전에 어떤 분이 세미나 오셔서… 본인이 사회과학 도메인에서 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인문학 -> 공학으로 가는 것보다, 공학 기반으로 인문학 터치(공학 -> 인문학)를 하는 게 더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다고 했는데… 나는 절.대.로. 동의하지 못한다. 이건 인문학부심이 아니라(부심을 왜부려… 내가 인문학 베이스로 사느라 얼마나 힘든데) 그냥 그런 사고체계와 사고 과정도 엔지니어링 스킬 만큼이나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결’을 미덕으로 삼는 공학과 ‘의심’을 근간으로 하는 인문학이 ‘융합’되는 게 그래서 그렇게나 어렵다.
여튼 대부분의 사람에게 20대의 삶은, 그 후의 궤적을 결정짓는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그건 마치 배를 운전할 때 2-3도 정도의 작은 각도의 변화가 몇 km 후의 암초나 장애물을 피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한다. 예전에 세일링을 갔을 때, 차와 배가 다르다는 점에 놀랐는데, 돌이켜보면 배를 운전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모양과 유사하고, 차를 운전하는 것은 삶의 여기저기에 솟아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과 비슷한 듯하다.
차에서는 핸들을 움직이면 바로 차체가 움직인다. 우리는 30도만큼 핸들을 꺾어서 30도 혹은 그 이상으로 차체를 움직일 수 있다. 지연은 별로 없다. 지면은 단단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길은 우리가 예측하는대로 나타난다. 하지만 배는 어떤가? 배는 지금 핸들을 30도 꺾으면 30초 후에 3분에 걸쳐 갑자기 90도 이상 돌아간다(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략 그런 느낌이다). 수평선에 보이는 장애물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30km 전에 0.3만 핸들을 꺾어도 그 장애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이 내용은 대체로 경험에 기반한 비유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결국에 무엇이든 제대로 가늠(estimation)하는 것이다. 이 일은 얼마짜리 일인가? 이 일을 몇 명이서 했을 때, 얼마나 걸리는가? 연구실에서 배운 것 중에 제일 잘 배운 게 바로 이 추산(estimation)이다. 석사 초반에는 5시간 예측하고 저녁부터 일을 시작하면, 꼭 밤을 새고 다음날 오전이 되어서야 일이 다 되었다. 점점 그 차이(gap)가 줄어들었고, 아마도 박사 마지막 학기 쯤에는 그 차이가 거의 0에 수렴했다.
다만, 그렇게 작은 일들에 대한 조정과 추산은 가능해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인생을 가늠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것이다. 시애틀 오면서 융대원 선생님들께 메일로 짧게나마 인사를 드렸었는데, 답장 중에 인상적인 게 있었다. W 선생님으로부터 온 메일의 일부를 인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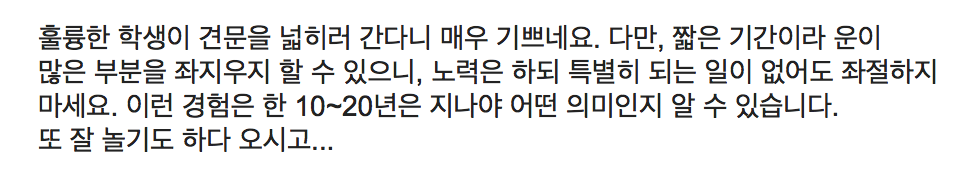 10-20년은 지나야 알 수 있다고…
10-20년은 지나야 알 수 있다고…
이 메일을 받고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꽤나 여러 차례 읽어봤던 기억이 난다. 그렇다. 뭐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자. 어쨌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갈 것이고, 1년 새에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언젠가 “아, 그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꿨어”라고 말하거나 “그때 그걸 ‘안해서’ 인생이 바뀐 것 같아”라고 말하게 될 수도 있겠지.
그나저나 딱 글쓰면 알 수 있는데, 쓰면서도 느꼈지만 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참으로 양비적인 인간이다. 하지만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는 단호하군.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거나 긍정으로 가득 차있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부럽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런 건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뭐… 어쩔 수 없지.